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 연구핏 잘 맞고 펀딩도 박사 기간 동안 RA 보장될거 같으면 걍 지금 붙은 학교들 그냥 가요. 거기 거절하고 재수해서 님이 말한 “탑스쿨” 간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요즘 같이 미국 비자 정책이나 연구 예산 문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겨우 이 정도 학교 차이 가지고 재수하는게 현명한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미 지금 붙은 학교들에서 박사, 포닥 하고 “탑스쿨”에서 교수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글에서 언급한 학교들 수준이면 어디 대신 어디 간다고 학교 이름만 가지고는 인생 크게 안바뀝니다. 차라리 나는 이 교수 밑에서 이거 연구해야겠다 개별 “랩”을 보면 모를까. 단, 지금 RA가 아니라 TA로 펀딩 오퍼 받은거면 좀 생각해볼지도.
다이렉트 미박 합격했는데 네임밸류가 아쉬워서 석사 후 재지원 고민입니다
- 재지원했을때 지금 붙은 학교들도 붙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붙은 학교들이 작성자분이 조기졸업을 했기때문에 포텐셜을 높게 보고 오퍼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언급하신 학교들이 절대 네임밸류로 손해보는 학교들이 아닙니다. 가서 얼마나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석사 후 재지원 하는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석사 하는 동안 실적 잘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이렉트 미박 합격했는데 네임밸류가 아쉬워서 석사 후 재지원 고민입니다
- 컬럼비아일 것 같네요. 거기가 이상하게 한국인 많이 붙이고 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소위 탑4도 좋지만 탑20 들어갔다고 해서 네임밸류 떨어져서 잘 안풀릴 것 같대면 그만큼 추한게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탑스쿨 들어간대도 다른 “밑 레벨“ 연구자들을 얼마나 깔보게 될 지도 가늠이 안되네요.
자고로 연구하는 사람이면 세상이 다 틀려도 내가 진리를 보이겠다는 야심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학교 랭킹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요. 실제로 진짜 대가들은 자기가 몸담아왔던 학교를 빛나게했습니다. 저어기 구석에 박힌 주립대도 무시안당하는 이유를 자기 존재자체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다이렉트 미박 합격했는데 네임밸류가 아쉬워서 석사 후 재지원 고민입니다
- 포항공대 다녀본 적 없거나, 인간관계 제대로 형성 못하고 밀려난 성격이상자가 쓴 글인가 싶네요. 근거도 틀린거 천지에요. 서울대 교수중에 포공 출신이 몇명인데 저런 말을 하는건지 모르겠고, 학교 자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수와 학생들의 노력과 활동도 상당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걍 적응못한, 혹은 주워들은 자기의 불만과 질투심을 배설한 글이라고 보이네요.
포항공대 가면 안되는 이유
- 서성한까지 끌어서 쓰는거보면 답 나오지않나 ㅋㅋ
포항공대 가면 안되는 이유
- 서성한 끝까지 붙히는거에서 답 나오고 ㅋㅋㅋㅋ
포스텍 학부나 박사 출신이 상위권 학교 교수로 간게 손 꼽힌다고? ㅋㅋㅋㅋㅋㅋ 진짜 머저리가 쓴 글인듯
포항공대 가면 안되는 이유
- 현직 교수인데 포스텍은 무슨 인서울 하위권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학위하지 마세요. 저렇게 깔짝하고와서 잘되는거 한명도 못봤습니다.
4학년 학부의 cs 컴파일러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등 보시면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실꺼에요. 대학원은 그 위를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아마 가시면 3년은 공부한다고 쓸거입니다.
지도교수랑 특히나 본인한테 매우 안좋은 선택이니 그냥 취미로 하지면서 교사생활 하세요
교사 포스텍 박사 지원은 불가능할까요?
- 와따시노 친친와 초거다이 데쓰. 라고 슬쩍 말해주면 반할듯
같은 랩메이트 짝사랑
-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잊으셨나요? 참나...
같은 랩메이트 짝사랑
- ㄹㅇ 근데, 그건 의사집단 봐도 똑같음. 그 안에서 정상인들도 많이 있는것도 비슷함.
그냥 본인이 공부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한 만큼 보상받고싶어하는 심리가 강해서 그럼.
근데 왜 얘네들이 유독 이러냐면 본인들 직업 특징이 '갑'의 위치에 있어서 그럼. 억제기가 없는거지..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수동공격적 성향은 직접적인 분노 표현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불만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순응·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극적 저항과 은근한 공격이 지속됩니다.
주요 특징
대놓고 반대하지 않지만 미루기·지연·“깜빡했다”를 반복하며 소극적으로 저항합니다.
비꼼·냉소·애매한 칭찬으로 상대의 노력을 은근히 평가절하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행동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책임은 회피합니다.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하거나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청은 수락하지만 실행은 형식적이거나 불완전하게 하여 상대를 곤란하게 합니다.
피해자처럼 보이려 하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식으로 상황을 흐립니다.
권위나 통제에 대한 반감이 강하지만 정면 충돌은 피하고 우회적으로 방해합니다.
관계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쌓인 분노가 냉소·거리두기로 나타납니다.
이 성향은 과거에 수동공격성 성격장애로 분류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독립 진단이 아니라 **성격 특성(traits)**으로 다뤄집니다. 또한 일부 행동은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의 평가절하 패턴과 겹칠 수 있지만, 핵심 동기는 우월감 유지보다 갈등 회피와 억눌린 분노의 간접 표현에 가깝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대충 뉴스로 읽어보니까 n=6까지는 사람이 증명한거고 일반화를 gpt로 했던데, 물론 일반화가 겁나 빡세다는건 모두가 다 알지만. 나는 학문이 ai에게 정복당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학자들에게 좋은 툴이 생겼다고 생각함.
카이석박 3년차, AI 요즘수준 보면 박사과정 현타옴
- 아니 포스텍 출신이 서울대, 카이스트에 거의 없다고 날조해서 반박했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지금은 딸려요ㅋㅋㅋ 왜 항상 포스텍 억까하는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논점 흐리면서 말만 띡 싸지를까
지금 재학생 졸업생들이 딸린다는 건 뭐 미래를 본건가 억까도 적당히 해야지ㅋㅋ
포스텍 억까에 대해2 (카이스트 전임교원 “박사학위” 출신 학교 통계)
수학, 철학 잘하는 메타인지 높은 사람 보셈
2025.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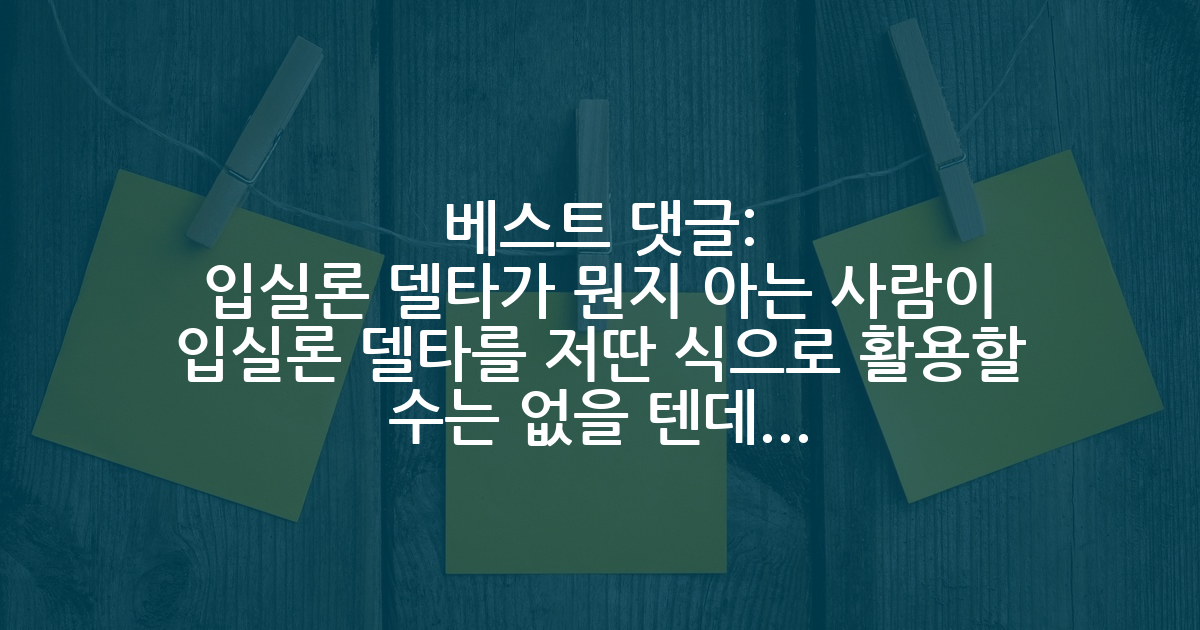
대부분은 멈추더라
왜냐면 그 순간부터 철학이 개입하니까.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맞잖아요”로 도망감.
칸트는 선험적 종합이라 했는데,
요즘은 그냥 if–then 유니버스라고 하지.
진리는 신이 아니라 정의와 가정이 만든 허구적 세계고
그 안에서만 ‘참’이라는 말이 산다고 생각함
수학 철학 제대로 하는 사람 있음?
Ivy League, sky 형들이랑 eps-delta부터 다시 시작하기 ㄱㄱ
※저는 철학자 A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말아주세요.
https://open.kakao.com/o/gd1SwvMh
-
어휴...ㅈ부생넷...
취미로 수학,물리 문제푸시는분있나요?-
-
-
학벌과 학력에 대하여
문과애들 솔직히 불쌍한데 놀리지 말자
수학과 대학원-
교수님들 학생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포항살이 대만족
베스트 최신 글
베스트 최신 글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 MIT EECS 합격했네요
- 후배의 부고
- 포항공대 가면 안되는 이유
- 연구할때 날림으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 공무원은 들어라. AI사업 교수 선정방법 알려준다.
- 분석은 제가 다 했는데.. 좀 속상해요
- 연구실 빌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진짜 사악한 연구실에 있는데
- 같은 랩메이트 짝사랑
- 남자친구가 논문 써줬는데
-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거 같다면 봐주셨으면 하는 글
- 카이석박 3년차, AI 요즘수준 보면 박사과정 현타옴
- 포스텍 억까에 대해 (동문의 학문적 아웃풋에 대한 반박)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다이렉트 미박 합격했는데 네임밸류가 아쉬워서 석사 후 재지원 고민입니다
- 인터뷰 관련하여 제가 잘 못한건지...
- 올리젝 예상..
- 미국 교수님들 질문
- [픽션] 연구비 야물딱지게 쓰는 팁
- 교사 포스텍 박사 지원은 불가능할까요?
- 전문연 입영연기 방법_ 전문연 하신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디지스트 로봇 vs 설카포 구조재료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현재 화학과에서 취업하기 좋은 세부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 AI 분야 석사의 취직&이직 후기 (2026 ver.)
- 포스텍 억까에 대해2 (카이스트 전임교원 “박사학위” 출신 학교 통계)

2025.10.24
대댓글 9개
2025.10.24
대댓글 1개
2025.10.24
2025.10.24
대댓글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