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 당연히 교수로써 해야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ㅋㅋ 이게 교수마인드구나 ㅋㅋ
능력 안되면 그냥 좀 꺼지세요..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ㅋㅋㅋ ist 교수라는데 능력이 안 되겠어요? 제발 현실을 좀 삽시다..뭐만 하면 교수 까고 싶어서 안달난 학생들 많더라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교수 됐으면 다 능력 좋다고 생각함? 여기 교수들 ㄹㅇ 마인드 소름돋네 ㅋㅋㅋ
그렇게 그냥 선민의식 속에서 사세요~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지나가는 박사과정 학생인데 윗댓글 보고 이상한게,
글에서 말한 '일정 학점이상 강의 열어야 하는것, 공간 시간 인프라 부족, 학생 수급어려움, 기본적인 학생 인건비 증가(종합대들은 등록금 전액면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 자동으로 인건비 증가)' <----이게 왜 교수이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임?
산학연계학생이고 졸업후 취업 정해져서 학계에 남을거 아닌데 저건 좀 이상한거 같음.
옛날 개념으로 교수=교육자+연구자 인건 맞음.
그런데 과거보다 연구 스케일이나 기술적 도달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특히 공대 교수들은 연구를 하려면 인문계 대비 인프라랑 비용, 인원이 필연적으로 증가함. 그러면 교육자이기 이전에 연구를 하려면 이런 뒷 배경이 필요한건 당연한거 아님?
그리고 저런걸 원하면 왜 능력부족인거임? 능력이 부족한건 우리가 평가할게 아니라 뽑아주는 대학교가 말할 권리가 있는거고ㅋㅋ 교수가 된거면 전체적인 평균 능력치는 되는 사람이라는거임.
그리고 저렇게 말하려면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가 이상적이라는 가정이 맞아야 하지 않음? 지금 정책적으로만 해도 ㅈ창나있는데? 연구비 풀린게 연구를 해야하는 사람들 보다 현저히 적은데 무슨 이상적인 연구 생태계임.
그리고 ㅈㄴ게 일반적인 전구체 시약 하나 사려고 해도 50~200만원은 훌쩍 넘는 ㅈ창난 supply chain을 가진 상황도 같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인프라를 챙기려고 한다고 실력이 없는거임?
그리고 교수가 아무리 타 직종보다 신념이 크게 작용한다도 해도 '직업'인데 더 근무환경 좋은곳을 선호하는건 당연한거 아님? 댓글 쓴 사람은 뭐든간에 직업의식만 챙길수있는 곳이면 ㅈ창난 ㅈ소가도 안주하고 드러눕는 루저인가봄.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일단 CEJ나 한 편은 쓰고 다시 오세요ㅎㅎ 아무리 콧대높은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저 정도급 저널을 무시하는 학생은 또 처음 보네요ㅋㅋ
Ist/성한 까지가 연구가가능한 교수라고생각함
- 슬기로운 로버트보일 ㅈㄴ 츤데레노
대학 안나온 사람도 실적 좋으면 교수 될수있나요?
- 이런 까내리기 댓글 종종 보이는데 어이가 없음...
그럼 의미 없을 수준도 못내는 사람들은 더 비참한거 아니냐
그리고 의미 없으니까 그냥 컨퍼런스에 논문 안내고 졸업할건가
그냥 sky 밑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지거국 학생이나 브실골플다 똑같다는 브론즈 생각남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어떤 연구실은 교수가 편애 하는 사람만 연구 내용 쓰레기여도 논문 쓰고 억셉 그냥 주는곳 있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억까당하고 논문 갯수로 불이익 당하는거 당해보면 정신 나가는데
에이아이 탑컨퍼 올려치기 없어져야됨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컬럼비아일 것 같네요. 거기가 이상하게 한국인 많이 붙이고 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소위 탑4도 좋지만 탑20 들어갔다고 해서 네임밸류 떨어져서 잘 안풀릴 것 같대면 그만큼 추한게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탑스쿨 들어간대도 다른 “밑 레벨“ 연구자들을 얼마나 깔보게 될 지도 가늠이 안되네요.
자고로 연구하는 사람이면 세상이 다 틀려도 내가 진리를 보이겠다는 야심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학교 랭킹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요. 실제로 진짜 대가들은 자기가 몸담아왔던 학교를 빛나게했습니다. 저어기 구석에 박힌 주립대도 무시안당하는 이유를 자기 존재자체로 만드는 사람들이요.
다이렉트 미박 합격했는데 네임밸류가 아쉬워서 석사 후 재지원 고민입니다
- 애리조나 너무 우습게들 보시네. ㅋㅋㅋㅋ
눈이 전부 하버드에만 가있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이 다 ㅈ으로 보이나봐요?
억셉해야 할까요?
- 누가 회복되었다고 하나요? 지금 교수님들 전부 다 펀딩 상황 안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뽑는 교수 수도 반이 줄었습니다. 물론 역량과 운이 따르고 네트워킹을 잘 한 분들은 미박을 가기도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박사진학관련하여 NTU오퍼 vs 미박도전 관련하여 선배 연구자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냉정히 말해서 YK에서 애리조나가면 잘못하면 다운그레이드지.
QS 랭킹이 항상 수준을 대변하지는 않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연대는 세계 50위권임. 애리조나는 280~300위권이고... 사실 네임벨류 문제인데 너무 떨어짐.
억셉해야 할까요?
- YK는 글로벌하게는 그냥 unknown school입니다.. 방글라데시 텍이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탑스쿨에 더 많이 유학시키는데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이처럼 연구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면 YK는 커녕 국내 어느 대학도 100위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글쓴이 정도면 애리조나 이상 입학할 역량이 되니까 노력해보라는 취지지 갑자기 애리조나가 YK보다 다운그레이드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말이 안됩니다.
억셉해야 할까요?
'SCI / 저널 / 임팩트팩터'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2021.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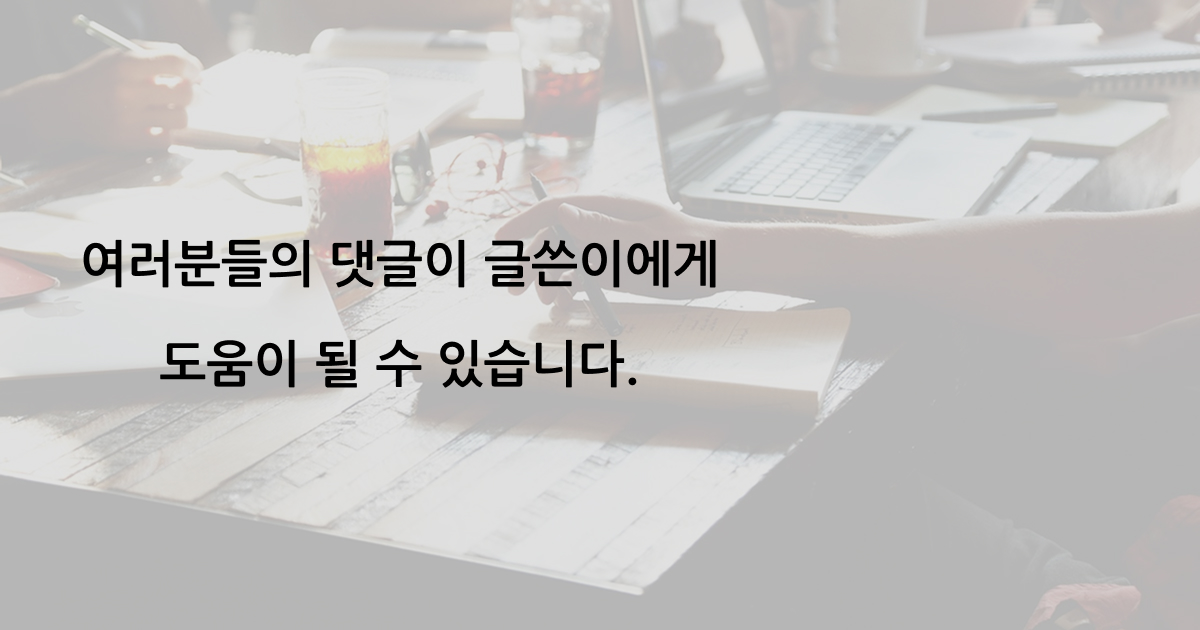
1. 대부분의 저널은 임팩트팩터가 있다.
2. 임팩트팩터가 높은것을 SCI급 논문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SCI 논문이라는것이 되기 위한 임팩트팩터 몇까지의 기준이 있나요?
-
-
나때문에 엄마가 포기한 것들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핫한 인기글은?
- 기계과에서 신소재로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해
- '한국교수의 단상' 글에 대한 아쉬움
- 교수님들 학생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 교수 육각형 부활안하나..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이런 연구실에 계속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데 확실한건 낭만의 시대는 이제 끝난것 같음
-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S대 교수가 쓰는 교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해주고싶은 말
- 연구는 뭘 잘해야 잘해?
- 연구하다가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 진짜 이번 주 알찼습니다
- 지방사립대 ist, ssh 이상 AI대학원 지원 가능할까요?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한양대 나노반도체공학과
- [석사 진학] 연구 분야 핏 vs 학교 간판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런 신생랩 가도 되나요
- 대학 안나온 사람도 실적 좋으면 교수 될수있나요?
- Ist/성한 까지가 연구가가능한 교수라고생각함
- 대학원 출근하면서 자퇴할까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 학부연구생 월급 보통 얼마나 받나요?
- 확실히 대기업 > 지방사립대교수
-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컨택 메일 CV 양식(김박사넷, LaTex(Overleaf) 등등)
- 자대 학연인데 타대 석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 '한국교수의 단상' 글에 대한 아쉬움
- 교수님들 학생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 교수 육각형 부활안하나..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이런 연구실에 계속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데 확실한건 낭만의 시대는 이제 끝난것 같음
-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S대 교수가 쓰는 교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해주고싶은 말
- 연구는 뭘 잘해야 잘해?
- 연구하다가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 진짜 이번 주 알찼습니다
- 지방사립대 ist, ssh 이상 AI대학원 지원 가능할까요?
- 미국 박사 네트워킹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미국 박사 대안으로 싱가폴
- 억셉해야 할까요?
- 어드미션 레터의 펀딩 관련 내용.. 뭐가 맞을까요
- 박사진학관련하여 NTU오퍼 vs 미박도전 관련하여 선배 연구자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싱가폴 ai 대학원과 국내 대학원
- [석사 진학] 연구 분야 핏 vs 학교 간판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런 신생랩 가도 되나요
- 대학 안나온 사람도 실적 좋으면 교수 될수있나요?
- Ist/성한 까지가 연구가가능한 교수라고생각함
- 대학원 출근하면서 자퇴할까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 확실히 대기업 > 지방사립대교수

2021.09.03
2021.09.03
대댓글 2개
2021.09.03
대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