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 애리조나 너무 우습게들 보시네. ㅋㅋㅋㅋ
눈이 전부 하버드에만 가있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이 다 ㅈ으로 보이나봐요?
억셉해야 할까요?
- YK는 글로벌하게는 그냥 unknown school입니다.. 방글라데시 텍이 국내 어느 대학보다도 탑스쿨에 더 많이 유학시키는데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이처럼 연구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면 YK는 커녕 국내 어느 대학도 100위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글쓴이 정도면 애리조나 이상 입학할 역량이 되니까 노력해보라는 취지지 갑자기 애리조나가 YK보다 다운그레이드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말이 안됩니다.
억셉해야 할까요?
- 낭만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함. 다들 누군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니 낭만이 없어 보이는 것일뿐
AI 연구로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안 쓰는 AI 연구가 요즘 시대의 진정한 낭만이라고 생각함.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는 낭만가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독창적인 시도가 쌓여 새로운 혁신과 낭만을 만드는 것임.
근데 확실한건 낭만의 시대는 이제 끝난것 같음
- 당연히 교수로써 해야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ㅋㅋ 이게 교수마인드구나 ㅋㅋ
능력 안되면 그냥 좀 꺼지세요..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ㅋㅋㅋ ist 교수라는데 능력이 안 되겠어요? 제발 현실을 좀 삽시다..뭐만 하면 교수 까고 싶어서 안달난 학생들 많더라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일단 CEJ나 한 편은 쓰고 다시 오세요ㅎㅎ 아무리 콧대높은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저 정도급 저널을 무시하는 학생은 또 처음 보네요ㅋㅋ
Ist/성한 까지가 연구가가능한 교수라고생각함
- 이런 까내리기 댓글 종종 보이는데 어이가 없음...
그럼 의미 없을 수준도 못내는 사람들은 더 비참한거 아니냐
그리고 의미 없으니까 그냥 컨퍼런스에 논문 안내고 졸업할건가
그냥 sky 밑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지거국 학생이나 브실골플다 똑같다는 브론즈 생각남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어떤 연구실은 교수가 편애 하는 사람만 연구 내용 쓰레기여도 논문 쓰고 억셉 그냥 주는곳 있는데
그러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억까당하고 논문 갯수로 불이익 당하는거 당해보면 정신 나가는데
에이아이 탑컨퍼 올려치기 없어져야됨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1. 이건 대량인쇄시 모아찍기 등으로 프린트를 안하면 관리자입장에선 이해는감. (잉크도 소모품이고 누군간 맨날 갈테니까) 그기아니라면 그냥 님 맘에안드는듯
2. 꼰대들이보면 좋은 자세는아닐수잇어도 굳이 입밖으로내는건 님 맘에안드는듯
3. 뚝배기 쳐도 무죄. 아마 평소에 님 벼르고있었던듯
4. 약속된 시간이 당일이었다면 뚝배기쳐도 무죄. 하루이틀 이상이라면 마감시간 지켜서 보내면 취합하는 입장에선 불안 짜증 날순있어보임. 근데 굳이 그걸또 뭐라하는거보면 님 맘에안드는듯.
5. 아픈몸이면 쉬었어야함. 그걸 이해바라고 일제대로 안하면 짜증남. 근데 그 마음이라도 알아주면좋을텐데 잡도리하는거보니 님 맘에안드는듯
여기다올려도 그사람은 님맘에 안들어서 지가뭔잘못한지도모름. 가서 뚝배기를 깨거나 맞다이
이런 거로 시비 걸린적 있으세요?
- 솔직히 그렇게 억울해보이진않는데요. 남에게 모든이유를 찾는거만봐도
이런 거로 시비 걸린적 있으세요?
- 어지간히 인성 쓰레기 아니면 실력자들 추종자들 많아서 소용없음ㅋㅋㅋㅋ
그리고 놀랍게도 보통 실력이 있는 애들이 인성도 좋음...
일부 머리좋은 학생들이 하는 위험한 착각
- 상관있음 ㅋㅋㅋㅋㅋ 예전처럼 한사람의 재능으로 회사나 조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물흐리는 사람 있으면 걍 교체하는게 이득임
일부 머리좋은 학생들이 하는 위험한 착각
- AI에 대체 되길 바라는 사람이면
평판 관리에 목숨 걸고 평생 조직에 숨어서 아닥하고 살면 됨
일부 머리좋은 학생들이 하는 위험한 착각
정적분석, 프로그래밍 코드 분석 관련 연구자 분들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1.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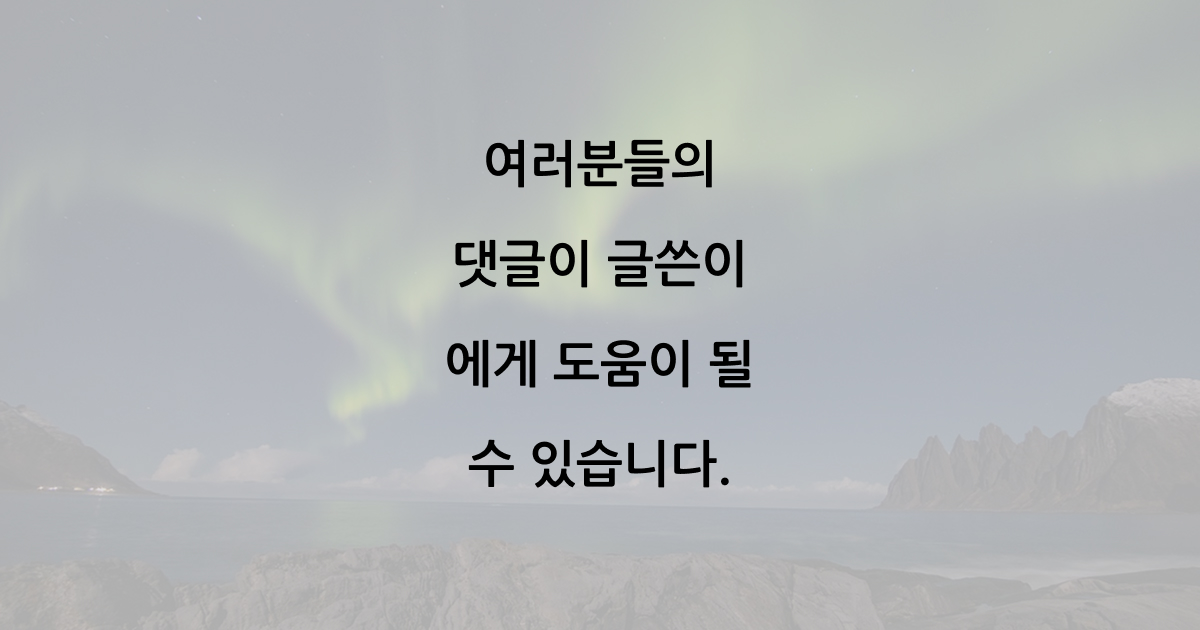
프로그래밍 코드 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그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논문으로 나온 다른 코드 분석 툴들을 보면 구현 양이 상당하더라고요.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보일 정도로요(경험상 github contributor가 복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동기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건가요? 과제를 맡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문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문적 관심이 겹치는 사람들이 논문을 같이 작성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
교수인데 학생들 너무 빡친다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핫한 인기글은?
- 기계과에서 신소재로 전공을 바꾸는 것에 대해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이런 연구실에 계속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데 확실한건 낭만의 시대는 이제 끝난것 같음
-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일단 저는 대학원이랑 관련없는 일반인이긴 한데요
- 석사를 계속 해도 되는걸까요
- 대학 안나온 사람도 실적 좋으면 교수 될수있나요?
- S대 교수가 쓰는 교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해주고싶은 말
- 연구하다가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 이런 거로 시비 걸린적 있으세요?
- 진짜 이번 주 알찼습니다
- 인공지능 대학원 랩실 졸업자 취업 현황 중 군대
자유 게시판(아무개랩)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Ist/성한 까지가 연구가가능한 교수라고생각함
- 랩실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 옛날에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 확실히 대기업 > 지방사립대교수
-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지방사립대 ist, ssh 이상 AI대학원 지원 가능할까요?
- 컨택 메일 CV 양식(김박사넷, LaTex(Overleaf) 등등)
- 자대 학연인데 타대 석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사 과정 4년차 졸업 고민
- CS/EE 교수 임용될 수 있는 범위/스펙
- 일부 머리좋은 학생들이 하는 위험한 착각
- 인건비 인상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볼까 고민입니다
- 지거국 (부경전충) 석박사 아웃풋의 현실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 대학 교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거 같다
- 이런 연구실에 계속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데 확실한건 낭만의 시대는 이제 끝난것 같음
- IST교수인데 종합대학 교수님들은 진짜 대단한거다
- 일단 저는 대학원이랑 관련없는 일반인이긴 한데요
- 석사를 계속 해도 되는걸까요
- 대학 안나온 사람도 실적 좋으면 교수 될수있나요?
- S대 교수가 쓰는 교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해주고싶은 말
- 연구하다가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 이런 거로 시비 걸린적 있으세요?
- 진짜 이번 주 알찼습니다
- 인공지능 대학원 랩실 졸업자 취업 현황 중 군대
- 미국 박사 네트워킹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억셉해야 할까요?
- 어드미션 레터의 펀딩 관련 내용.. 뭐가 맞을까요
- 박사진학관련하여 NTU오퍼 vs 미박도전 관련하여 선배 연구자님들 조언을 구합니다.
- 싱가폴 ai 대학원과 국내 대학원
- [무료] 2026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 스타터팩 이벤트
- Ist/성한 까지가 연구가가능한 교수라고생각함
- 확실히 대기업 > 지방사립대교수
- 석사 때 탑컨퍼 쓰고 나가시는 분들 넘 부럽네요
- 지방사립대 ist, ssh 이상 AI대학원 지원 가능할까요?
- 자대 학연인데 타대 석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CS/EE 교수 임용될 수 있는 범위/스펙
- 일부 머리좋은 학생들이 하는 위험한 착각
- 인건비 인상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볼까 고민입니다

2021.07.14
2021.07.14
대댓글 2개
2021.07.15